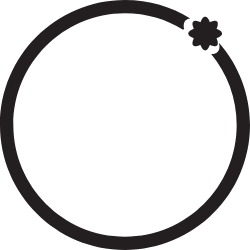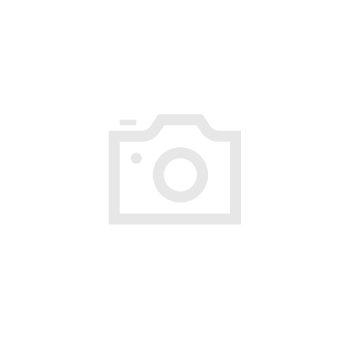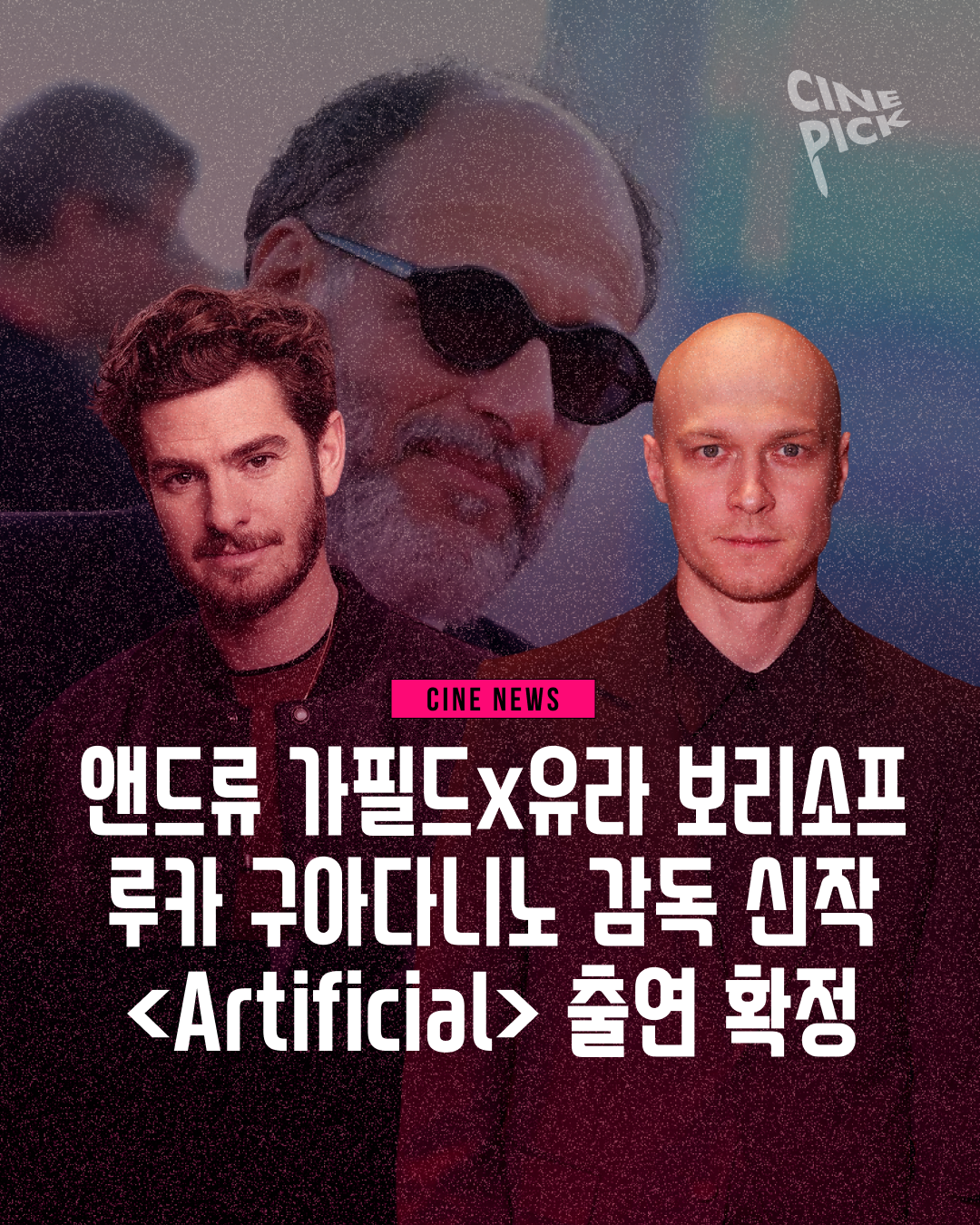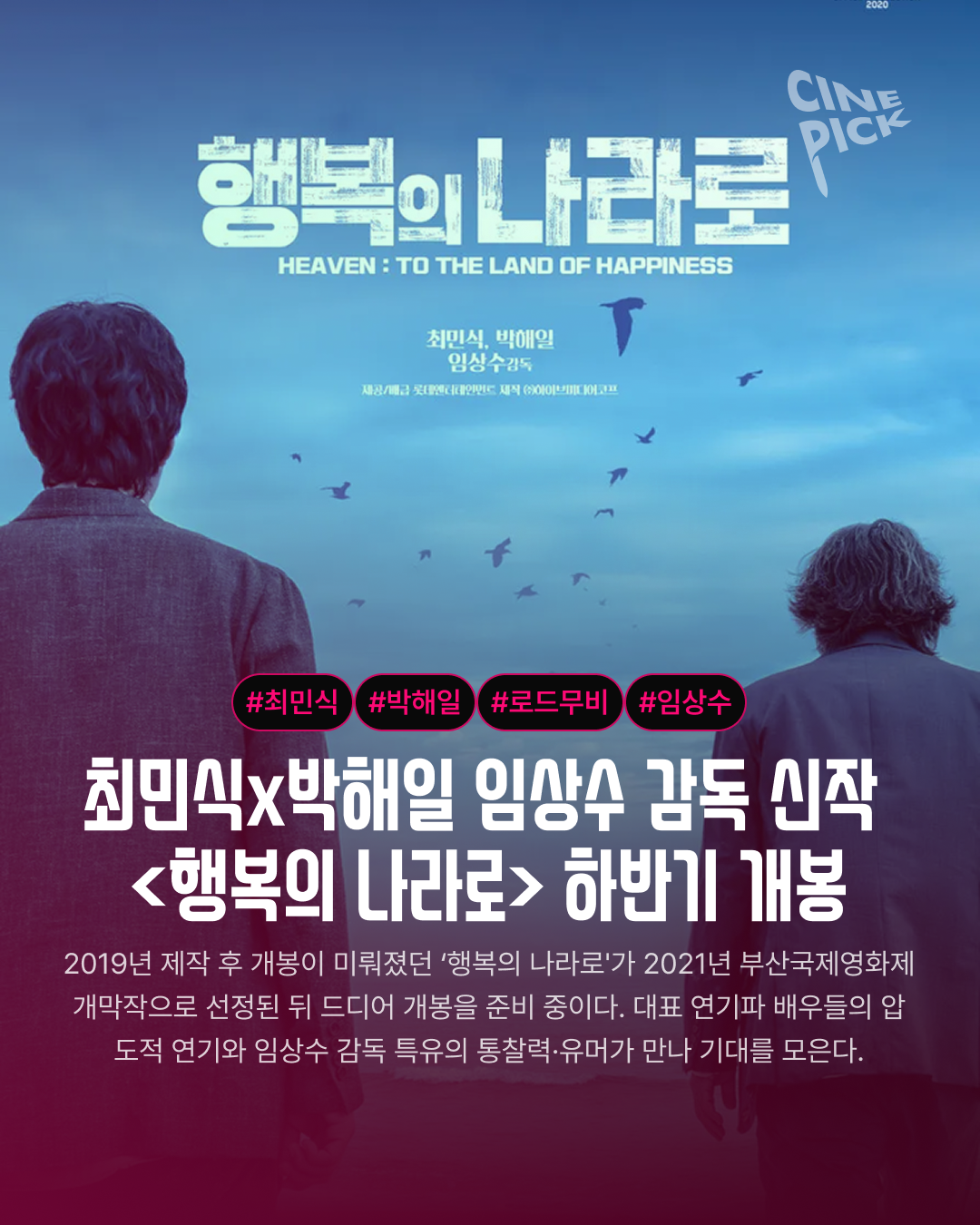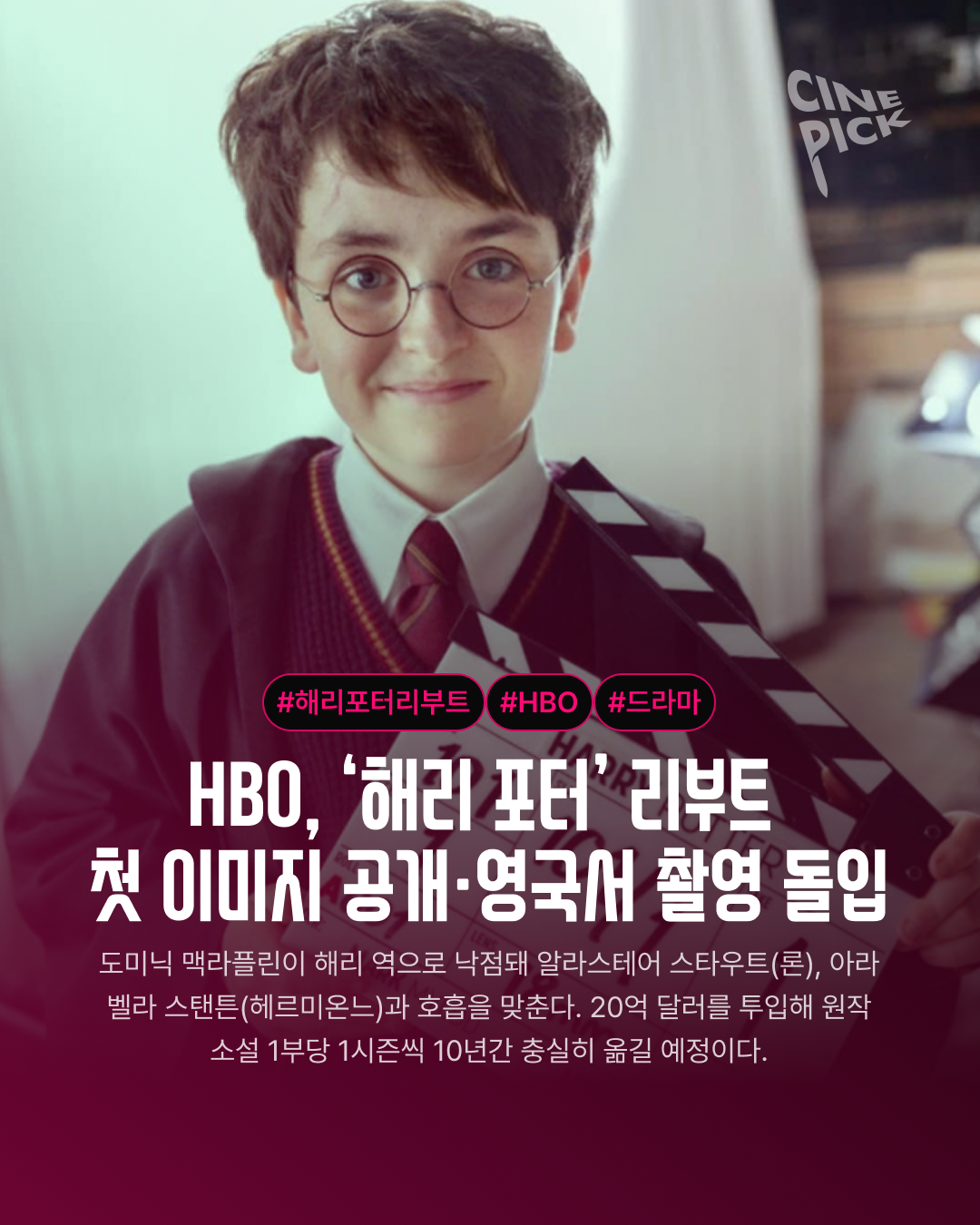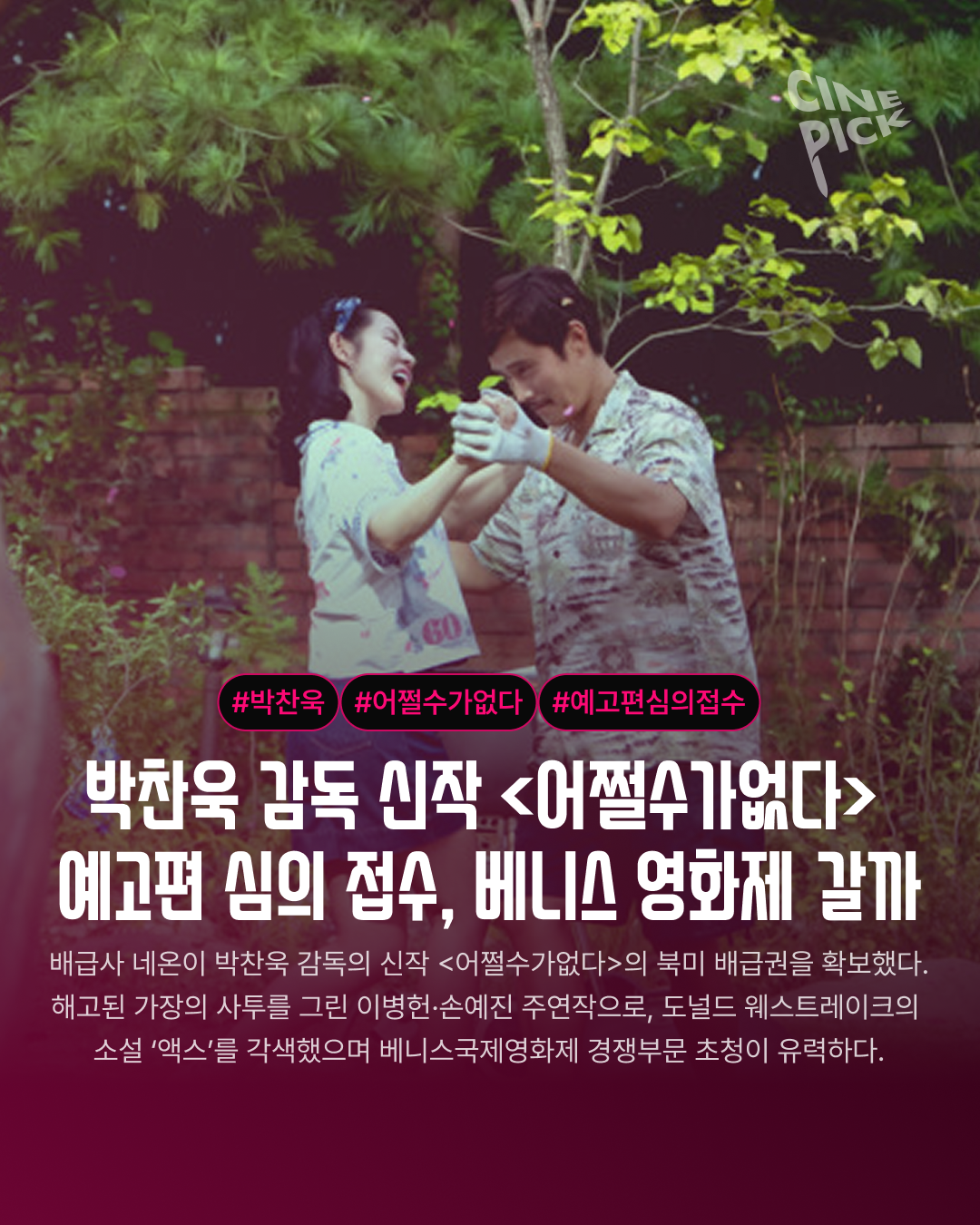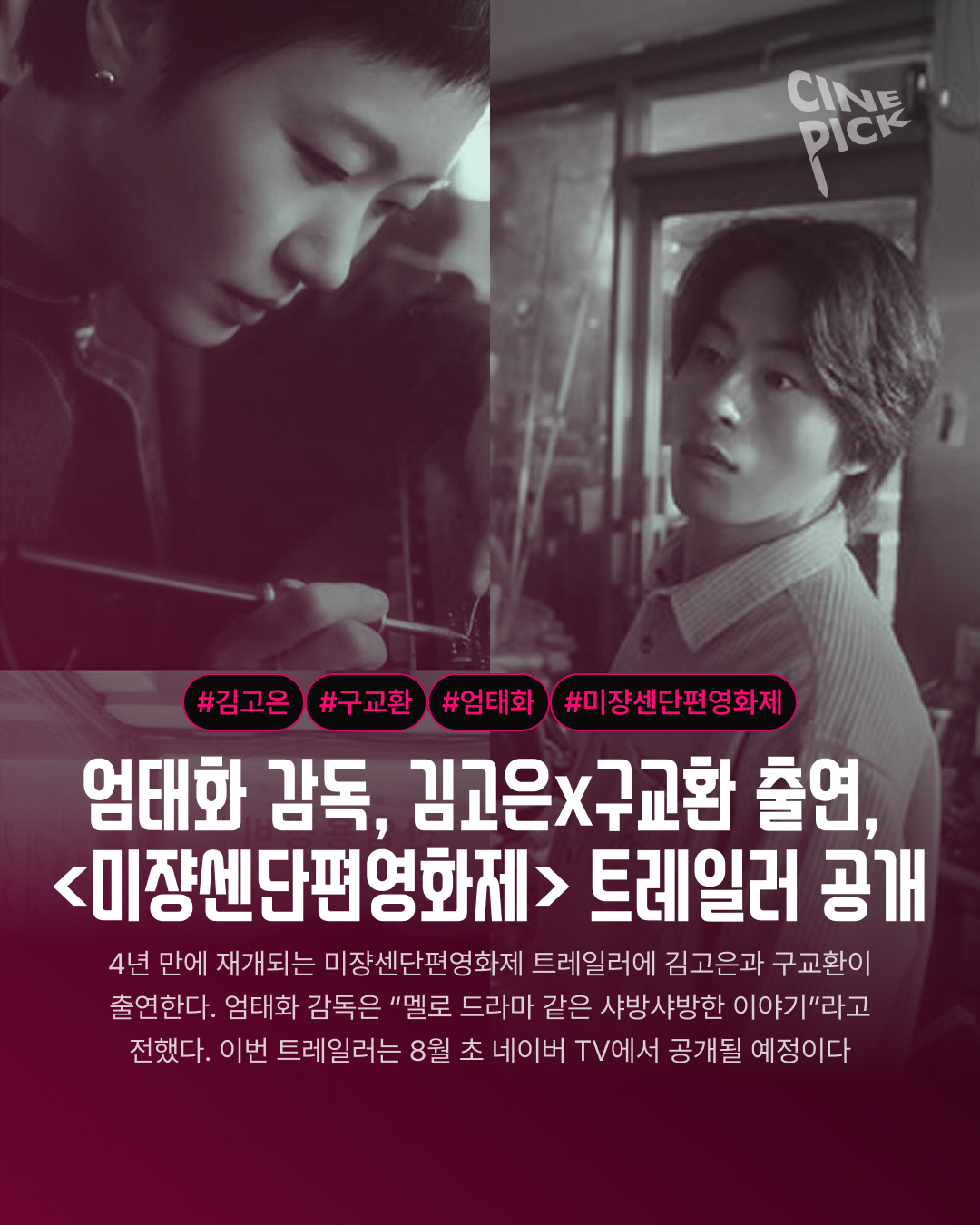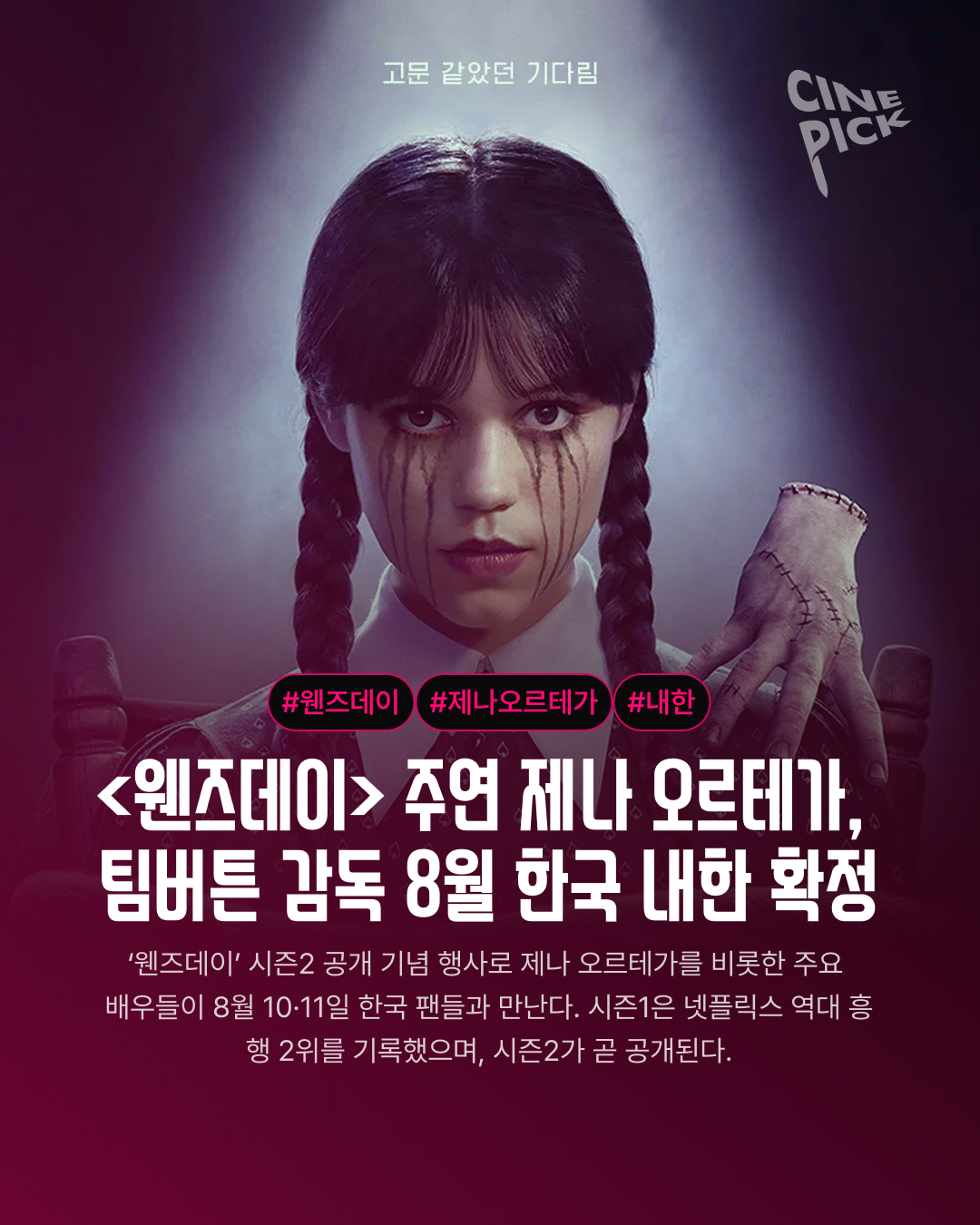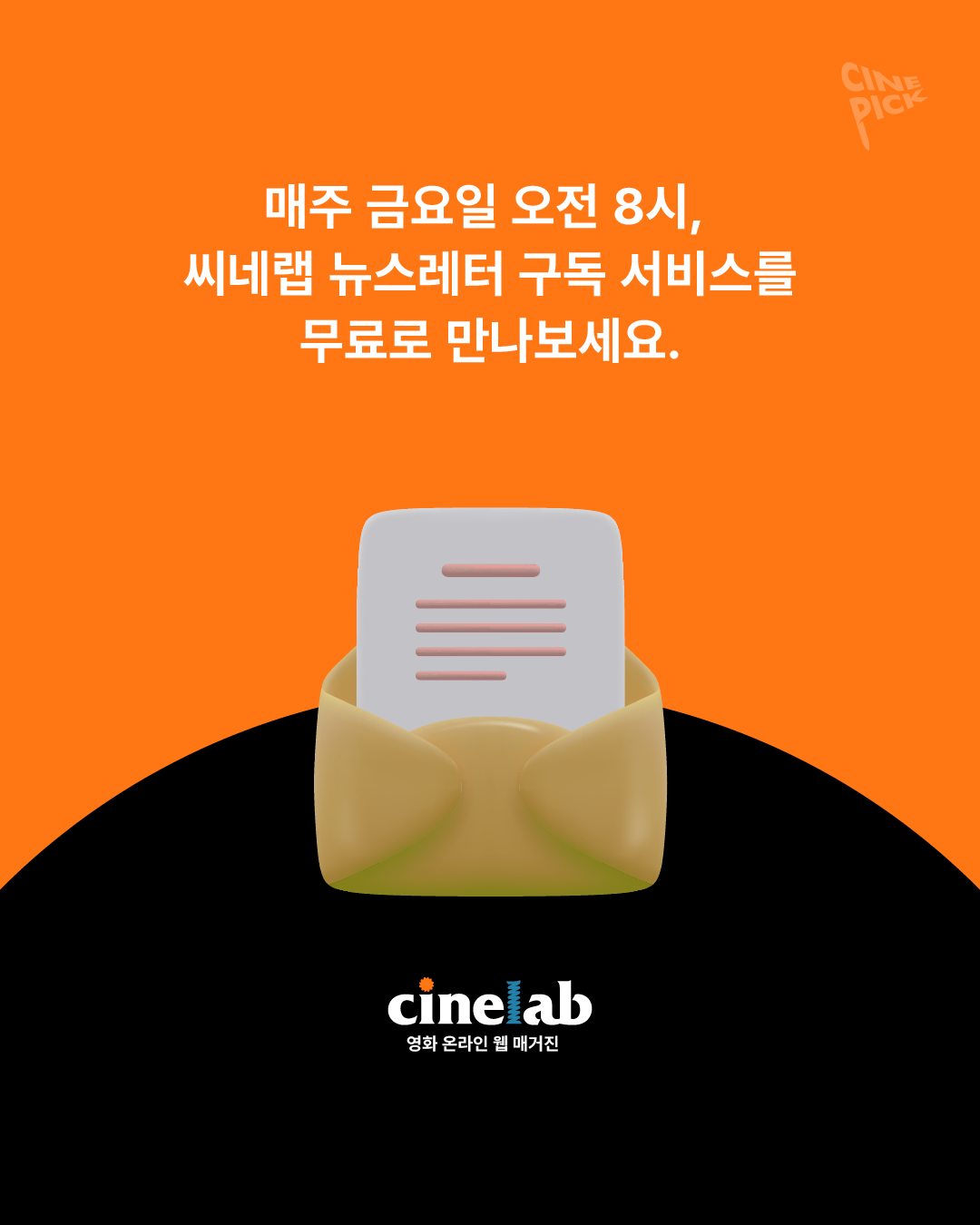퐁주2025-07-18 12:20:5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믹의 지름길> (2010)
<믹의 지름길>

왜 제목이 '믹의 지름길'인가 하면 우리가 여태껏 믹의 지름길을 따라왔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한 것 같다. 믹은 비호감이지만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결말 즈음에는 에밀리 부부에게 결정권을 돌린다. 역사는 이래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턴이 주어진다.
러닝타임이 1시간 44분인 영화인데, 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황야에서 세 마차가 걷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을 수 없어지는 것은 마차 바퀴의 끼익 끼익 하는 소리다. 처음에는 말들의 신음 소리인 줄 알았다. 물과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말을 아낀다. 그저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시간들 속에서 세 그룹은 동물들의 부담을 줄이려 자신들은 옆에서 걷는다. 믹은 시종일관 자기 말 한 필 위에 앉아서 이동한다. 그 모습이 얄밉다. 믹 외의 남자들은 동물들을 끌고, 여자들은 몇 걸음 떨어져서 걷는 형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는 여자들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여자들이 불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도 생각했다. 젊은 부부 중 아내인 밀리는 히스테리를 터트린다. 여기서 히스테리란 가부장에게 자기 존재를 의지하고 맡긴 채 자신은 사태에 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 혼란스러움이 폭발하는 것이다. 믹은 여자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한다. '저는 여자들은 카오스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파괴로부터 왔죠.'
영화 속 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자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식구가 정착할 만한 '기회의 땅'을 찾는 것이다. 식수를 찾고, 금을 찾고,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야만적인 인디언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엔 그런 남자를 믿는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자기가 믿는 것은 당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만히 걷는 와중에 생포된 인디언이 눈에 들어온다. 에밀리는 인디언에게 저녁식사를 나눠준다. 그에게 식수를 준다. 이 두 단계에서 두 사람의 소통은 분명히 발전한다. 처음에는 거칠고 퉁명스러워 보이게 접시를 내려놓았던 인디언이 두 번째에서는 부드럽게 그릇을 내려놓는 것이다. 에밀리는 돌에 벽화를 그리는 그의 신발을 바느질로 고쳐준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서 믹의 비아냥과 밀리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에밀리는 '빚지기 싫다'고 말했지만 정말 인디언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그런 의도 때문이었을까? 에밀리는 같은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인륜, 천륜적인 마음을 자신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익숙한 자본주의의 틀 대로 자기 마음을 읽어낸 결과가 '빚지기 싫다'이다. 그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언어 틀이 부족했던 것이다.
<믹의 지름길>에서는 <퍼스트 카우>가 선명하게 보인다. (북미 개봉 순서대로 하면 반대겠다) 땅과 바다에 주인이 없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모색해야 했던 19세기 서부개척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한다. 나는 그 시대를 여태껏 봐 왔던 서부극의 신나고 열정적인 황야의 모험으로 상상했었다. 하지만 라이카트는 말이 없고 막막한 끊임없는 걷기로 개척 시대를 나타낸다. 두 영화는 모두 우정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질서가 없고 삶과 죽음이 손바닥 뒤집듯 되는 시대에서 서로를 믿고 피어나는 그런 우정 말이다. (에밀리의 라탄 바구니를 들고, 그 안의 돋보기를 유심하게 보는 인디언)
세 마차 중 한 그룹은 특히 독실하여, 쉬는 시간에 그들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왼다. 어린 지미가 있고 글로리는 임신한 상태다. 물을 거부하던 남편 윌리엄은 걷다가 쓰러진다. 이 상황에서 인디언은 윌리엄의 주변에 모래를 뿌린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세 구의 마차를 옮길 때 가만히 지켜만 보던 상황과 완전히 대조된다. 윌리엄이 쓰러졌을 때 인디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의 노래는 영화 속 인물들과 영화 밖 관객들 모두에게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온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생이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느낌을 가져오는 것이다. 힘들게 전진하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 말이다.
믹이 인디언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그 총구가 화면을 향하므로 관객은 마치 우리에게 총이 겨누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믹에게 에밀리가 총을 겨누어 만들어지는 삼각 구도를 보며 왠지 눈물이 났다.
라이카트는 섬세하게도 처음에는 인디언을 밧줄로 감아 줄에 매인 채로 이동하게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는 그를 줄에서 풀어낸다. 그를 묶어봤자... 물을 발견하기가 더욱 늦어질 뿐이다. 우리는 결국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끊나지 않을 것 같은 황야라는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물을 찾아내야 하는 운명공동체다.
미래를 아는 관객은 우리 주인공들이 물이 있는 지역, 혹은 인디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인디언 마을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 과거의 폭력은 행해졌다. 황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