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리2025-07-28 03:41:41
누구나 불완전한 몸, <우리 둘 사이에>

어떤 투렛 증후군을 가진 이들은 특정 단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내뱉음으로써 긴장을 완화한다고 한다.
나는 '엄마'를 외친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힘껏 반응해주니까, 소리를 질러도 "왜 그래?" 항상 부드럽게 물어주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떠올라 나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엄마를 부르면 뭉개뭉개 피어오르던 나쁜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진다.
하지만 요즘에는 엄마 앞에서 외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 한 번 습관처럼 계속 불렀다가 걱정하는 눈짓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엄마, 즉 무엇이든 이해해주는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떠오를 때면, 굴하지 않고 '엄마'를 외친다.
영화 <우리 둘 사이에>를 오랜 시간 곱씹으며 생각했다.
‘지후’는, 나의 상상 속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후는 은진과 같은 산부인과 병실을 쓰게 된 인연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인물이다.
은진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다. 다정한 남편 호선과의 사이에서 아이(쪼꼬)를 갖게 되며 출산을 결심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변화는 휠체어 생활에 익숙한 은진에게 몹시 버겁다.
점차 배가 불러오며 방광이 자극되지만, 하반신 마비로 인해 화장실에 가야 할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순간, 더 깊은 수치심이 몰려온다.
게다가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는, 그 원인이 자신의 장애 때문일지도 모른다며 자신을 자책한다.
그럴 때마다 등장해 은진을 위로하는 인물이 바로 지후다.
산책을 시켜주고, 출산 가방을 싸라고 조언해주며,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것도 지후였다.
그러나 영화 후반, 은진이 병실에서 연락처만 주고받았을 뿐 이후 실제로 지후를 다시 만난 적 없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토록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지후는 결국 은진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이 드러난다.
헛것을 보게 되었음을 깨달은 은진은, 뱃속의 아기에게 자신이 '아프다'며 엄마가 견뎌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헛것을 보는 은진이 아픈 게 아니라, 삶을 견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성지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몸을 가진 모든 이들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말로 해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이 말을 들으며 나 역시 생각했다.
헛것을 보지 않는 나도, 힘들 때면 내가 바라는 모습의 상상 속 ‘엄마’를 찾는다.
은진은 헛것을 보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지만, 인물의 한 단면만 확장해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 감독의 말처럼,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장애’로 인식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분노, 자기 혐오,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기에,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은진이 떠올리는 '지후'는 단지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은진이 자신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삶의 버팀목이며,
또한 우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상상 속 존재들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는 모두,
몸이든 마음이든 불편한 부분 하나쯤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고,
그 불편함을 껴안고 삶을 계속해간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은진에게 상상 속 지후가 힘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랬듯이 항상 상상과 현실의 인물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굴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둘 사이에>는 처음엔 그 주제가 온전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은진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주치는 휠체어를 탄 산모는 그녀가 원래부터 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감독의 의도를 모른다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늘어나는 영화다.
장애와 비장애, 육체와 정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사유하는 영화를 찾는다면 이 작품을 적극 추천한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함께 곁들여 읽으면 좋을 작품으로는, 장애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설 <헌치백>을 추천하며 글을 맺는다.
이 글은 씨네랩 크리에이터로 초청받아 작성했습니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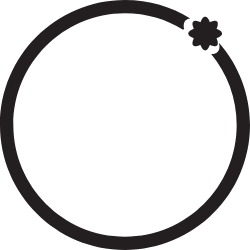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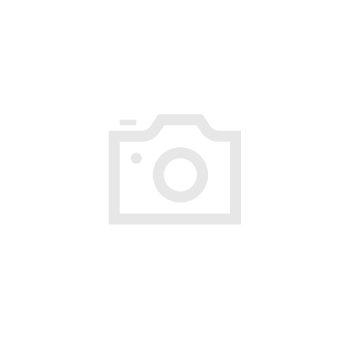


























.png)
.png)


.jpg)

